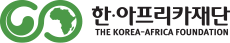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앙골라 루안다(Luanda)에서 개최된 제17회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한·아프리카재단 조사연구부가 매주 전하는 최신 아프리카 동향과 이슈 |
|
|
원조가 아닌 비즈니스: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아프리카 접근법 |
|
|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앙골라 루안다(Luanda)에서 개최된 제17회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U.S.-Africa Business Summit)은 아프리카 12개국* 정상과 2,700명 이상의 미국과 아프리카의 민관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 회의는 아프리카기업협의회(Corporate Council on Africa, CCA)**가 주관했으며, 각국 정부·기업·투자기관 관계자들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미-아프리카 간 상업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석 국가(국명 가나다순): 가봉,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보츠와나, 부룬디, 상투메프린시페, 알제리,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보베르데, 콩고민주공화국
**1993년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 간 상업적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워싱턴 D.C. 소재 무역 협회로, 현재 18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대표단은 트로이 피트렐(Troy Fitrell) 국무부 아프리카국 선임국장을 중심으로,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EXIM),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무역개발청(US Trade & Development Agency, USTDA) 등 경제·통상 관련 핵심 기관의 고위 인사들로 구성됐다. 피트렐 선임국장은 아프리카를 ‘원조’가 아닌 ‘투자 주도 성장’의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며, 미국 기업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비즈니스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규제 장벽, 시장 접근성 문제 등 상업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미국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회의 기간 중 앙골라의 농업 물류 및 통신 인프라, 시에라리온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시설,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를 아우르는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 총 25억 달러(한화 약 3.4조 원) 규모의 개발·투자 약정이 체결됐다. ▲제17차 미-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미국 대표단 명단(공식 홈페이지 기재순)
-트로이 피트렐(Troy Fitrell) 국무부 아프리카국 선임국장
-마사드 불로스(Massad Boulos) 아프리카 담당 대통령 선임고문
-코너 콜먼(Connor Coleman) 국제개발금융공사 투자총괄 겸 비서실장
-제임스 버로우(James Burrows Jr.) 수출입은행 부의장 대행
-코스턴스 해밀턴(Constance Hamilton) 무역대표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토마스 하디(Thomas R. Hardy) 무역개발청 청장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5월 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s of Commerce, AmChams)가 주관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Abidjan) 비즈니스 서밋 당시 제기됐던 우려와는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대외원조 삭감,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갱신 보류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피트렐 선임국장의 상업 외교(commercial diplomacy)*가 전면에 부상하며, 미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은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용어로, 정부가 외교 자원을 활용해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무역·투자 확대 등을 지원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기업의 개별 활동과 시장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의 경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외교(economic diplomacy)와 구분된다.
|
|
|
한편, 마사드 불로스(Massad Boulos) 아프리카 담당 대통령 선임고문은 평화·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30여 년 동안 갈등을 이어온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고, 그 결과 4월 25일 양국 외교장관이 기본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에 합의했다. 이어서 6월 27일에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임석 하에 양국이 동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협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7월 중 정상 간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백악관에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원조 중심의 전통적 협력에서 벗어나 자립 기반의 무역 파트너십으로 대아프리카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오는 9월에는 유엔(UN) 총회 계기에 더 많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상업적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가봉,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세네갈
|
|
|
제17차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좌)마하무드 알리 유수프(Mahmoud Ali Youssouf)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과 만나 악수하는 (중)마사드 불로스(Massad Boulos) 美 아프리카 담당 대통령 선임고문과 (우)트로이 피트렐(Troy Fitrell) 美 국무부 아프리카국 선임국장ⓒ주아프리카연합 미국상주대표부 페이스북 |
|
|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조하는 ‘상업 외교’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번 주 아프리카 위클리는 공개된 보도자료 및 국내외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상업 외교 전략의 핵심 인물 2명-①트로이 피트렐 국무부 아프리카국 선임국장, ②마사드 불로스 아프리카 담당 대통령 선임고문-의 공개 발언을 분석하며, 동 전략의 수립 배경과 추진 과정, 그리고 향후 전개 방향을 살펴본다. |
|
|
+ 피트렐 선임국장이 설계하는 상업 외교 전략 |
|
|
피트렐 선임국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니 주재 대사를 역임했으며, 에티오피아 및 모리셔스에서도 외교 경력을 쌓은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다. 그는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무부 아프리카국 선임국장에 임명된 이후, 미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전략을 원조 중심에서 무역·상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제17차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막식에서 피트렐 선임국장은, 아프리카가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약 25억 명이 거주하고 16조 달러 이상의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수출 비중은 지난 20년간 정체되어 전체 상품 무역의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무역 부진의 원인으로,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이 오랫동안 상업적 참여보다는 개발 원조를 우선시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은 거시적 개혁에 집중한 나머지 현지 진출 기업들이 마주하는 제도적 장애 요인을 간과해왔으며, 기존 전략은 느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중국 등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위험보다 보상이 크다는 확신을 미국 정부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원조가 아닌 무역(Trade, not aid)”을 기조로 한 상업 외교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피트렐 선임국장은 다음의 6가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피트렐 선임국장이 밝힌 상업 외교의 6대 실행계획
① 아프리카 주재 모든 미국 대사에게 상업 외교를 최우선 과제로 부여
② 부패 청산, 인허가 가속화, 법치 강화 등 시장 개혁을 아프리카 정부와 공동 추진
③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프라 수주 확대
④ 외교 순방을 민간 기업에도 개방해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
⑤ 미국 내 30만 개 수출 기업과 아프리카 수요처의 연계 강화
⑥ 미국 내 무역·금융 개혁을 통해 더 빠르고 유연하며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 *앙골라 로비토(Lobito) 항구에서 시작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광산 지역을 연결하는 약 2,000km 길이의 대형 물류 인프라 사업이다. 2023년 10월,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 주재 대사들의 성과를 미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성과와 거래 성사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간 체결된 33건, 총 60억 달러(한화 약 8.2조 원) 규모의 거래는 상업 외교 전환의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후에도 각국 대사관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협상의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조율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 고위급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상무부·DFC·EXIM·USTR·USTDA 등 핵심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괄 협의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협상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무역·금융 관련 제도 개편도 병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를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도록 산업계 인식 개선도 병행 중이다. 피트렐 국장은 상업 외교가 지속 가능하려면 아프리카 역내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그는 “다른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지만, 각국의 내정과 통치 방식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
|
+ 상업 외교의 평화 기반을 다지는 불로스 선임고문 |
|
|
피트렐 선임국장이 주도하는 상업 외교 전략이 아프리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가 용이하도록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불로스 선임고문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불로스 선임고문은 피트렐 선임국장과 같은 시기에 임명되어 함께 아프리카 전략을 총괄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외교 관료인 피트렐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레바논계 미국인 사업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돈으로, 수십 년 간 나이지리아에서 물류 및 중장비 기업 CEO로 재직하며 아프리카 사업 환경에 대한 실전 감각을 키워왔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워싱턴식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점을 발휘하는 바탕이 됐다. 2025년 4월, 격화되는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분쟁 해결을 위해 불로스 선임고문이 현지에 급파됐다. 아프리카연합(AU)과 인근 국가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교착 상태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형식적인 협상 틀을 넘어선 접근이 가능한 인물로 평가받은 것이다. 그는 혁신적인 해법을 추구하기보다는, AU,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 기존 지역 협의체의 논의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안보 여건 개선을 전제로 동 지역의 막대한 광물 자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 약속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그 결과, 4월 25일 양국 외교장관은 기본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에 합의했고, 이어서 6월 27일에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임석 하에 이 원칙을 토대로 한 평화협정 초안이 마련됐다. 아프리카리포트(The Africa Report)紙와의 인터뷰에서 불로스 선임고문은 초안에 “방어적 조치(defensive measure)”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개념(reference)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의미(actual meaning)”라고 강조하며, 당사국이 해당 표현의 맥락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 협정이 정상 간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평화협정 초안(25.06.27.) 주요 내용
- 방어조치(defensive measure) 해제와 르완다해방민주군(FDLR)의 무력화
- 영토 보전 존중 및 적대행위 금지
- 양국 간 공동 안보 조정 체제(joint security mechanism) 구축
- 국내 실향민 및 난민 귀환 지원
- 역내 경제 통합 기반 조성 |
|
|
+ ‘원조가 아닌 비즈니스’로의 전환, 그 미래는? |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아프리카 정책은 기존의 개발 원조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상업 외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전략 설계자인 피트렐 선임국장은 제도 개혁, 투자 연계, 기업 참여 등 상업 외교의 체계를 마련했고, 불로스 선임고문은 안보 불안이라는 근본적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동 전략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무역을 통한 자립과 상생이라는 기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정치적 명분을 뒷받침하고 있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가봉,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동 정상회의는 불로스 선임고문이 밝힌 전략 방향, ①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총체적 접근보다 지역 단위 중심의 선택적 접근 전략, ②같은 투자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우선 고려하는 실용적 외교 전략과 일치한다. 조셉 세니(Joseph Sany) 미국평화연구소(USIP)* 아프리카센터 부소장은, “가봉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나이지리아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 국가 중심의 접근이 상업 외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회의 참가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세네갈조차 GDP가 약 350억 달러(한화 약 48조 원)에 불과하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 내 18위에 해당한다. 그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상회의가 더욱 자주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4년 미 의회가 분쟁 예방·해소 및 평화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독립적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동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개별적 관심사 외에도, 다음과 같이 역내 거버넌스 및 안보 질서 회복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제들이 다뤄졌다. ▲ 미국-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회의 주요 의제
- 사헬 지역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방지(preventing the spillover of violent extremism form the Sahel)
- 민주주의 후퇴 반전(reversing democratic backsliding)
- 불법 이민 차단(stemming illegal immigration)
-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강화(ramping up the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and Russia) 아프리카리포트紙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국별 관세 부과 시한을 9월 1일로 설정했으며 이는 AGOA 연장 문제와 연계된 패키지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는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더 많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업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 년이 지났지만, 정책 변화의 속도와 파급력은 상당하다.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이 아닌 투자 주도 성장의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하려는 미국의 상업 외교 전략이 과연 지속가능하고 호혜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특히 9월 유엔 총회를 전후로 예정된 아프리카 지역별 정상회의는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층 한·아프리카재단 · TEL : 02-722-4700 · FAX : 02-722-4900 |
|
|
|
|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