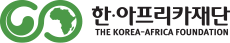아프리카 대륙이 직면한 심각한 전력난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책으로 기존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 대신 한·아프리카재단 조사연구부가 매주 전하는 최신 아프리카 동향과 이슈 |
주목받는 아프리카 원전 시장, 한국형 SMR 진출 시동 |
아프리카 대륙이 직면한 심각한 전력난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책으로 기존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 대신, 보다 유연하고 분산형 공급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주목받고 있다. SMR은 건설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성과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추고 있어,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위클리에서는 아프리카 내 원전 도입 현황과 글로벌 원전 기조 변화 속에서 한국의 기회 요인을 조망한다.
|
+ 아프리카 전력난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 |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작고 단순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에 운반해 설치가 가능한 원자로이다.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수조원의 건설비가 들며 건설 기간도 10년 가까이 걸려 매우 길고,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SMR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축소가 가능하며 대부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부품으로 조립하기에 건설 비용 및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원자력은 운전 중 탄소 배출이 없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태양광·풍력과 달리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복잡한 외부 전력 공급 없이도 공기나 물 같은 자연의 힘만으로 원자로 냉각이 가능해,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 기술로 평가받는다. 아프리카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의 전력 수요는 2050년까지 거의 7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상당수 국가의 전력 보급률은 50%에 못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SMR은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 대비 초기 투자 부담이 낮을 뿐 아니라 기존 전력망과 연결이 어려운 도서, 산간벽지 지역이나 산업단지 등 독립적인 전력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통적 원전 도입이 어려운 중소 국가나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SMR 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25년 6월, 글로벌 에너지 전문 싱크탱크 ‘성장허브를 위한 에너지(Energy for Growth Hub)’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 도입 준비 수준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원전 도입 수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주요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년 이전에 상업용 원전 가동이 가능한 아프리카 국가로는 남아공과 이집트가 있다. 남아공은 전체 전력의 5% 가량을 원자력으로 생산하며 쾨버그(Koeberg)에서 아프리카 유일의 상업 원전을 운영 중이다. 남아공 정부는 1994년부터 고온가스로 SMR인 페블베드모듈원자로(Pebble bed modular reactor: PBMR)*를 개발했으나, 2010년 예산 삭감과 상용화 지연으로 인해 수년간 유지관리(care-and-maintenance) 단계로 전화했다. 그러다 최근 남아공 정부측은 이에 대한 재가동 결정을 발표했다. 카고시엔초 라목고파(Kgosientsho Ramokgopa) 남아공 전력부(Ministry of Energy and Electricity) 장관은 2025년 6월, 엔리트 아프리카(Enlit Africa)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남아공이 보유한 SMR 기술을 다시 가동하고, 이를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겠다”고 밝혔다. *SMR의 한 형태로, 수천 개의 구슬 모양 연료볼(pebble)을 사용하고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활용하는 고온가스로형 원자로이다. 안전성이 높고 크기가 작아 전기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산업용 열 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는 원자로로 평가받는다.
**매년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산업 컨퍼런스이자 전시회이다.
이같은 정부 발표와 함께, 남아공의 민간기업 스트라텍(Stratek)社는 중단됐던 PBMR 기술을 바탕으로 고온 헬륨 냉각형 SMR인 ‘HTMR-100’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HTMR-100은 복잡한 냉각 시스템 없이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고, 고장이 나더라도 자동으로 안전 상태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광산지대나 외딴 산업 지역처럼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도 활용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트라텍은 코야 캐피탈(Koya Capital)과 협력하여 약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HTMR-100은 단순한 신기술 개발을 넘어, 남아공이 과거부터 축적해온 원자력 기술의 부활을 상징하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유일한 SMR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집트는 러시아 원자력공사인 로사톰(Rosatom)과 협력해 4.8GW 규모의 엘다바(El-Dabaa) 원전을 건설 중이다. 이는 남아공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의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된다. 2022년에 착공한 엘 다바 프로젝트는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규모 총 300억 달러 중 85% 상당이 로사톰의 대출로 조달된다. 로사톰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핵연료를 공급하고, 이집트 인력 교육을 지원하며, 초기 10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를 도울 예정이다. 둘째, 2030년 이후 원전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는 가나, 케냐, 모로코, 우간다, 알제리, 튀니지 등이 있다. 가나는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여를 목표로 2034년까지 약 1,000MW 원전 도입을 추진해왔다. 2024년에는 총 924MW 규모의 SMR 건설을 추진했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공급사들이 경쟁한 끝에 미국의 뉴스케일(NuScale)社가 최종 선정되어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뉴스케일의 기자재 공급사인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社 역시 향후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케냐는 2027년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고 2034년까지 첫 상업 원전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냐원자력청(The Nuclear Power and Energy Agency: NuPEA)은 2025년 3월, 중국원자력공사(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와 핵에너지 기술 이전과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uPEA는 SMR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비 검토를 진행 중이며, SMR을 도입한다면 향후 비용·입지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MR 도입 후보지로 지목된 동남부 킬리피 주(Kilifi county)의 우욤보(Uyombo)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서부 시아야(Siaya)로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사회적 수용과 환경에의 영향,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2050년까지 원전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르완다 외 12국가들이다. 르완다 정부는 10년 내에 110M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24년 8월, 미국 나노뉴클리어에너지(NANO Nuclear Energy)社와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최근에는 키갈리(Kigali)에서 ‘아프리카 원자력 혁신 정상회의(Nuclear Energy Innovation Summit For Africa)’*를 개최하여 40개국 이상의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 투자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에두아르 응기렌테(Edouard Ngirente)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르완다가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을 현재 1GW에서 약 5GW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공개했으며,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한 대륙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환경을 조성하자고 촉구했다. *르완다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 세계핵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 WNA)와 공동으로 개최했다(2025.6.30.-2025.7.1.). 의제는 “SMR과 미니모듈원자로의 잠재력(The Potential of Small Modular and Micro Reactors in Accelerating Africa’s Energy Transition)”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넷째, 관심은 있으나 아직 진입 장벽이 높은 국가로는 나이지리아, 말리, 부르키나파소, 수단, 등이 있다. 이들은 원자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있으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제도 미비, 재정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이 정체되어 있다. |
‘성장허브를 위한 에너지(Energy for Growth Hub)’ 보고서는 아프리카 내 원자력 기술 수요와 협력의 흐름에서 두 가지 주요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러시아의 공세적인 원자력 외교 전략이다. 로사톰(Rosatom)은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기존 협력국 외에도 나미비아, 니제르, 짐바브웨, 부룬디, 콩고, 기니 등 최소 20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다수는 초기 단계의 MoU 체결 수준이지만,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원자력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반면, 미국은 아프리카 원자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원자력 외교에서 러시아보다 한 발 뒤쳐진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둘째는 SMR에 대한 관심 확대이다. 가나, 남아공, 르완다, 모로코 등은 SMR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술 파트너십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이는 실질적인 원자력 도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2030년대 SMR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지금부터 제도적 준비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립한 국가들이 초기 수혜자가 될 것이라 강조한다. 또한, 단순 기술 도입 여부보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립 및 역량 강화,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책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금융 조달 모델,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 같은 제도 기반과 정치적 의지의 유무가 실질적인 도입 여부를 좌우한다고 제언한다. |
오랫동안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원자력은 이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한국을 포함한 31개국 이상이 참여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한다는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논의 수준이었던 COP28에 비해 더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의지를 담은 정책 선언으로,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은행(World Bank)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온 세계은행은 2025년 6월 11일, 원자력을 투자 제외 목록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다른 국제 금융기관들의 유사한 정책 완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세계은행의 이번 결정에 미국의 정책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2035년까지 아프리카에서 SMR이 최대 1.5G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SMR 1기(100MW)당 2억~3억 달러에 달하는 고비용과 송배전망 확보, 연료 운송 등의 인프라 연계 문제는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집트 사례에서 보듯이, 원자력 수출은 기술 이전뿐 아니라 설계·건설·금융이 결합된 종합 패키지 사업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자국 내에서 상업용 SMR을 가동 중이며, 자체적인 자금 조달로 적극적으로 SMR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원전 시장도 이처럼 기술력과 자본력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
+ 한국형 SMR의 경쟁력, 놓칠 수 없는 기회 |
한국은 세계 최초로 소형원자로가 자국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국가이다. SMART(시스템-통합형 선진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제작을 맡아,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100MWe급 원자로이다.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모델인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100MWe급 소형모듈원자로로, 원자로·계통기기·안전계통이 하나의 압력용기에 통합된 형태이다. 주로 중소 전력망 국가나 해수담수화 시설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SMART 기반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SMR 모델로, 탄소중립·수소생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며, 2030년대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아직 아프리카 내 구축된 SMR은 없지만, 가나·남아공·이집트 등 주요 국가들이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Brakah) 원전 수출을 통해 대형 원자로 분야에서 설계·건설·운영 능력을 이미 입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과 기술력이 SMR 수출에서도 경쟁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인프라 제약, 전력수요 분산, 탄소중립 목표 등으로 SMR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층 한·아프리카재단 · TEL : 02-722-4700 · FAX : 02-722-4900 |
|
|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