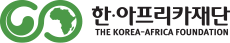아프리카의 항공 산업은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산업이다. 미국의 보잉(The Boeing Company)은
한·아프리카재단 조사연구부가 매주 전하는 최신 아프리카 동향과 이슈
|
아프리카의 항공 산업은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산업이다. 미국의 보잉(The Boeing Company)은, 아프리카 대륙의 항공 여객 운송량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4.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프랑스의 에어버스(Airbus)도 2042년까지 항공 부문 연간 서비스 수요가 2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항공사들 또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프리카 외 글로벌 항공사들도 아프리카 노선망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항공사는 에티오피아 항공(Ethiopian Airlines)이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76억 달러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중장기 전략을 세워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를 하나로, 아프리카를 세계로”(Bringing Africa Together and Beyond)라는 모토 아래 노선을 광범위하게 확장하며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역내 항공 운수 산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
에티오피아 볼레 국제공항에 줄지어있는 에티오피아항공기 |
에티오피아 항공은 정부 지분 100%의 국영기업으로, 80개국 이상 국가와 130개 이상의 도시에 취항 중인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항공사다, 에티오피아 항공의 성장은 에티오피아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이점을 줄 수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성장을 발판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를 역내 항공 허브로 성장시키고 외화 수입 확대, 국내 산업 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그리고 아프리카 역내 질서 개편을 이루고자 한다.
비전2025(Vision 2025)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에티오피아 정부 및 에티오피아 항공이 추진한 사업전략이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아프리카의 새로운 정신’(New Spirit of Africa)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발전을 항공 산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비전2025의 세부 목표에는 △연간 매출액 100억 달러 △여객 이용객 수 2,200만 명 △화물 운송량 82만 톤 △국외 120개 도시 취항 △항공기 120기 보유 등이 있다. 이 중 취항지 수 및 항공기 보유 목표는 달성한 반면 그 외 세부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 그러나 2024/202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액 76억 달러, 여객 이용객 수 1,900만 명이라는 실적을 남겨, 목표 달성에 상당히 근접했다.
비전2025에 이어, 에티오피아 항공은 새로운 전략 로드맵인 비전2035(Vision 2035)를 발표했다. 동 전략에 대해 미어탭 테클라예(Miretab Teklaye) 에티오피아 항공 한국 지사장은 “에티오피아 항공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선도적인 20대 항공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스핀 타세우(Mesfin Tasew) 에티오피아 항공 CEO는 2035년까지 △연간 매출액 250억 달러 △여객 이용객 수 6,500만 명 △화물 운송량 3백만 톤 △국외 207개 도시 취항 △항공기 271기 보유 달성을 비전2035의 세부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볼레 국제공항(Bole International Airport)은 현재 연간 약 1,700만 명 이상의 여객을 수용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공항을 계속 확장하여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을 약 2500만 명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항공이 성장하고,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신공항 건설 계획을 세운 상태다.
비쇼프투 공항(Bishoftu International Airport) 건설은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2040년까지 연간 여객 수용 능력 1억 명을 목표로 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항공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비쇼프투 공항 허브는 공항 시설 외에도 쇼핑몰, 호텔, 물류단지 등의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조성되어 관광, 물류, FDI 유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밝혔다.
비쇼프투 공항 부지는 기존 볼레 국제공항에서 40km가량 떨어져 있다. 예정된 총 부지 면적은 약 35km²로, 이 규모는 세계 15위권의 공항 면적 규모이고, 실제 완공되면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Paris-Charles de Gaulle Airport)보다 크다. 또한, 동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은 1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2019년에 개항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인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Da Xing International Airport)에 쓰인 공사비 110억 달러와도 엇비슷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신공항 프로젝트를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5년 8월 12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 달러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AfDB는 이미 에티오피아 아이샤(Aysha) 풍력 발전, 탄자니아·부룬디·콩고민주공화국 간 철도 개발 등 다양한 초대형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금 조달 구조를 성공적으로 설계해왔다고 밝히며, 이번 프로젝트 또한 상업은행, 개발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과 협력하여 구조화된 자금 조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역시 에티오피아 정부의 신공항 건설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9월 29일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마사드 불로스(Massad Boulos) 미국 아프리카 담당 선임고문(U.S. Senior Advior for Africa)은 미국이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 신공항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며, 동시에 보잉 사측과 협력하여 에티오피아 항공이 항공기를 수입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부분 재정 조달에서 난관을 겪곤 한다. 대표적으로 르완다 키갈리에 위치한 부게세라 국제공항(Bugesera International Airport)의 경우 막대한 건설 비용을 감당할 재원이 부족하여 결국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에 지분 60%를 넘긴 바 있다. 또한, 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인 스리랑카는 중국 차관을 제공받아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를 건설하였으나 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난 까닭에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기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프라 구축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재원 조달 및 운용상의 문제로 인해, 공항과 항구 등이 국가 전략 자산임에도 지분·운영권을 타국에 넘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에티오피아 정부는 비교적 순조롭게 비쇼프투 공항 프로젝트의 초기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 아프리카 역내 항공사들: 전통적인 강자의 부진과 떠오르는 유망주 |
이집트 항공(Egypt Air)은 1932년 설립되어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운영해 온 아프리카 내 항공 산업의 전통적인 강자이다. 이집트 항공은 2024년 하반기 기준 60여개 국가에서 90개가 넘는 도시에 취항 중이며, 그 중 아프리카 내에서도 이집트 국내를 제외하고 21개국 25개의 도시에서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집트 항공의 성장 속도는 더딘 상태다. 아프리카 대륙 내외로 에티오피아 항공, 라이언에어(Ryan Air), 이지젯(Easy Jet) 등이 이집트 항공의 경쟁사로 성장하며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고, 지난 10년간 이집트의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80%가 넘게 폭락하면서 운영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집트 항공은 지난 2011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 및 대출로 재정난을 극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냐 항공(Kenya Airways)은 아프리카 내 30개 이상의 도시에 취항 중이다. 케냐의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omo Kenyatta International Airport)은 케냐 항공에 힘입어 동아프리카와 다른 대륙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케냐 항공 역시 지난 10년간 적자 행진을 이어 왔으며, 현재 부채 및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항공사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영 항공사 남아프리카 항공(South African Airways)은 지난 2020년 파산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자금난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이 여파로 남아공 내 제1의 항공사 지위는 에어링크(AirLink)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에어링크는 아프리카 내에서 좌석 수를 기준으로 3위, 운항 편수를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항공사다. 에어링크는 남아공을 거점으로 남아프리카 지역의 노선망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데, 총 취항지 수는 50여 곳에 달한다.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O.R. 탐보 국제공항(O. R. Tambo International Airport)은 그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허브 공항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으나, 남아프리카 항공의 파산 이후로 이용객 및 취항지 수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어링크는 남아공의 항공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링크와 더불어 성장세에 있는 대표적인 아프리카 항공사는 르완다 항공(Rwanda Air)이다. 르완다 항공의 잠재성이 큰 이유는 르완다가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아프리카의 환승 허브로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르완다 항공의 성장에 한 몫 한다. 르완다 정부는 국가변혁전략(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I)을 발표했는데, 10가지 주요 전략 중 여섯 번째가 바로 르완다 항공 확장을 통한 항공부문 개발이다. 더불어 르완다는 2000년대 이후 연평균 7~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즉, 르완다 항공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다름 아닌 르완다 경제의 높은 성장에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
+ 아프리카 시장으로 확장하는 아프리카 역외 항공사 |
아프리카 시장의 유망성을 보고 아프리카 역외에서도 아프리카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항공사가 두 개 있는데, 중동의 3대 항공사에 해당하는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 및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이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현재 아프리카 19개국에 취항 중이고, 주간 운항편수는 약 160여 편에 달한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1990년대 이집트 카이로를 시작으로 취항지를 단계적으로 늘려왔으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계기로 아프리카 내 노선망을 전략적으로 정착시켰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공격적인 아프리카 노선망 확장과 함께 두바이 국제공항(Dubai International Airport)은 아프리카 외부에서 내부로 통하는 항공망의 허브로 꼽힌다. 두바이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데, 특히 한국에서 아프리카 국가들로 갈 때에도 두바이가 주요 경유지로 활용되곤 한다.
한편, 카타르 항공은 아프리카 내 약 30개의 취항지에 운항 중이다. 카타르는 2017년 촉발된 카타르 외교 위기*로 인해 아프리카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있다. 당시 리비아, 세네갈, 예멘, 이집트 등의 국가는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으며 가봉, 니제르, 차드 등의 국가는 카타르에서 자국 대사를 철수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카타르 항공이 운행하던 이집트, 리비아, 세네갈 등으로 향하는 노선은 중단되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은 카타르 국영 항공사인 카타르 항공의 영공 출입을 불허해, 카타르 항공을 이용해 아프리카로 가는 경우 약 2~3시간에 걸쳐 해당 영공을 우회할 수 밖에 없어 비효율성이 높아졌다. 4년 후인 2021년, 카타르와 각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카타르 항공의 아프리카 노선 운항은 다시 활력을 얻었다.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 하에 일부 아랍권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카타르와 단교하거나 및 자국 대사를 철수시킨 사건이다.
카타르 항공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도 아프리카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는 카타르 항공이 단순히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타르 항공을 통해 아프리카 항공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카타르 항공은 르완다 항공의 지분을 49%, 남아공 에어링크의 지분을 25% 취득했으며, 카타르 항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두 항공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알라산 와타라(Alassane Ouattara)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에어 코트디부아르(Air Cote d'Ivoire)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분의 일정 부분을 카타르 항공에 넘겨주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터키 항공(Turkish Airlines), 에어 프랑스(Air France) 등도 상당한 존재감이 있어, 향후에도 주요 항공사들이 아프리카 항공 시장 선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항공·운수·관광 분야 산업은 외화 조달에 효과적이다. 특히 국가 항공운수 산업 육성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태국은 수완나품 국제공항(Suvarnabhumi International Airport) 및 국영 항공사 타이 항공(Thai Airways)을 중심으로 관광 산업에 힘을 싣고 있으며, 수완나품 공항은 동남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타이 항공은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사로 각각 역할하며 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항공 운수 산업을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사례로 에티오피아를 빼놓을 수 없다.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에티오피아 항공 산업이 2037년까지 20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IATA는 에티오피아의 항공 산업이 전망치대로 성장할 시, GDP 기여액이 최소 93억 달러 이상 될 것이며, 항공 산업 및 관광 산업 등 연계된 산업에서 일자리가 약 90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에티오피아는 자국이 가진 항공 환승 허브라는 이점을 활용해, 관광업도 함께 육성 중이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환승객들을 위한 스톱오버 프로그램(Stop-Over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승 대기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승객에게 무료 아디스아바바 투어 프로그램 및 무료 숙박 제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디스아바바를 환승지에서 관광지로 바꾸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
아프리카의 역내 연결성은 타 대륙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진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프리카의 총수출 대비 역내 수출 비중은 12.7%로 유럽(68.5%), 아시아(58.5%), 아메리카(53.6%)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역내수입 비중도 12.9%로 유럽과 아시아의 1/4에 채 다다르지 못했다. 또 아프리카의 항공 화물량은 전 세계의 항공 화물량의 단 1.8%만을 차지한다. 아프리카의 역내 무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관세·비관세 장벽, 비효율적인 관료제와 더불어 교통 인프라의 한계가 꼽힌다.
아프리카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전반이 매우 열악하다. 얀 하벤가(Jan Havenga) 스텔렌보쉬 대학(Stellenbosch University) 교수는, 남아공의 경우 철도 인프라의 노후화와 운영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 2022년 기준 GDP의 6%에 달하는 수출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아프리카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항공 이용객 숫자는 전 세계 항공 이용객의 2%에 불과하며, 아프리카 항공편들은 평균적으로 여객기 수용량의 76%만 채워진 채로 운행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러한 현실을 아프리카 항공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많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AfDB는 역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개발 분야로 선정하고, 교통 및 연결성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 경제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교통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면, 역내 무역이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FDI를 더욱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아프리카의 역내 무역을 개선하고, 아프리카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AU의 주요 전략으로 꼽힌다. AfCFTA의 주요 협정 조항으로 물적 및 인적자본의 이동 용이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022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AfCFTA는 전체 무역량 대비 아프리카 역내 교역량 비중을 현재 18%에서 2030년까지 50%, 2024년까지 65%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항공 인프라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아프리카 인프라의 한계를 활용하여, 에티오피아 항공 산업 육성 및 신공항 건설로 아프리카 역내 교통망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향후 항공, 관광, 물류, 제조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의 동-서, 남-북을 잇는 중간 거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역내 인프라 문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호주의 정책 및 정치적 불안정성도 항공 시장 성장의 장벽으로 꼽힌다.
아프리카의 항공 시장은 대부분 국영 항공사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항공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자국의 국영 항공사가 아닌 민간 항공사 및 외국의 항공사가 자국에 노선을 확장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다. 비록 이전과 달리 노선망의 규제가 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항공 자유화 정책이 실행될 때 아프리카 항공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도 역내 노선망 확장이 저해되는 큰 원인으로 꼽힌다. 내전 혹은 분쟁이 발생할 시, 공항과 같은 전략 자산은 가장 먼저 점거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되며, 항공사들은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것이 아프리카 항공 산업 발전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마다가스카르의 대규모 청년 시위는 10월에 군사 정권 수립으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에어 프랑스, 에미레이트 항공, 에어 모리셔스(Air Mauritius) 등 주요 항공사는 마다가스카르의 정치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마다가스카르 노선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 비록 아프리카의 항공 산업은 △인프라 문제 △폐쇄적인 정책 △정치적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에티오피아 항공의 가파른 성장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장 가능성 역시 큰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2009년 수주한 아르빌 신공항(Erbil Internation Airport)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18개국 39건의 해외 공항사업을 수주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수주하는 사업에는 사업 컨설팅, 위탁 건설 및 운영,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향후 아프리카 항공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K-공항 역시 수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에티오피아 항공이 운행 중인 인천-아디스아바바 직항 외에도, 여객 및 화물 직항편도 확대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 항공 산업 성장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해외 시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Why It's a pain to take a plane in Africa". The Economist. 2025-08-07
"South Africa's disintegrating freight railway is crippling firms", The Economist, 2023-01-17
Salimata Kone, "Qatar Airways and Emirates ? two giants vying for Africa’s skies", The African Report, 2025-10-17
Paramita Sarkar , "Chaos in Madagascar! Air France Joins Emirates and Air Mauritius in Suspending Flights As Political Unrest Escalates into Attempted Coup", Travel and Tour World, 2025-10-15
"The $10 Billion Mega-Airport Financing Partnership Between Ethiopian Airlines and African Development Bank Takes Off", AfDB, 2025-8-12
최지혜, "[인터뷰] 에티오피아항공 한국 지사장 '2035년까지 20대 항공 그룹 목표'", 열린뉴스통신, 2023-11-20
"News: US pledges support for $10bn airport project in Ethiopia, considered Trump’s first major Horn of Africa initiative", Addis Standard, 2025-10-2
김한나, “에티오피아 외환제도 개혁 발표 이후 동향”, 코트라, 2024-09-06
이학재, [기고] 인천공항, 해외 공항사업 확대…GICC 2025서 K-Airport 전략, 뉴스 1, 2025-09-02
“에티오피아 항공 산업 동향”,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2023-11-13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층 한·아프리카재단
· TEL : 02-722-4700 · FAX : 02-722-4900
kaf@k-af.or.kr
수신거부 Unsubscribe |
|
|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